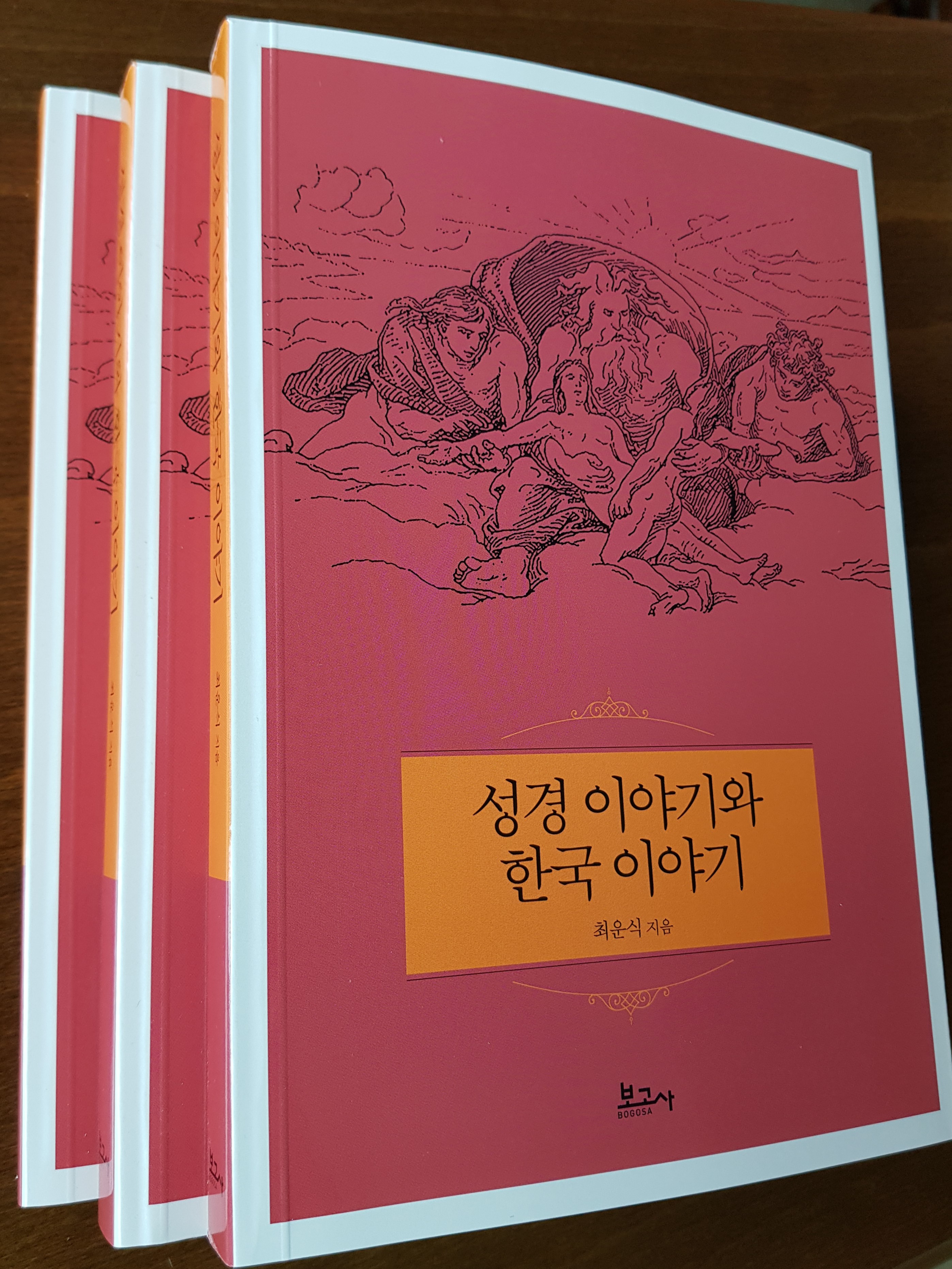
지은이: 최운식 출판사: 보고사(031-955-9797)
《성경 이야기와 한국 이야기》가 보고사에서 나왔다. 이 책에서 필자는 성경 이야기와 대응되는 한국 이야기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고, 이들 이야기가 지닌 교훈적·신앙적 의미를 정리하였다.
'이야기'는 어떤 사물이나 사실, 현상에 대하여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하는 말이나 글이다. 이야기는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의 상상력이나 영감에 의해 꾸며질 수도 있다.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이들 이야기에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깊은 뜻과 계획이 녹아 있다.
한국의 이야기는 한국인이 오래 전부터 생활 속에서, 공동의 의식에 의해 형성된, 일정한 구조를 가진 이야기이다. 그 중에는 진실하고 신성하다고 믿는 ‘신화’도 있고,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하며 증거물을 제시하는 ‘전설’도 있으며, 흥미 위주의 ‘민담’도 있다. 그 속에는 우리 민족의 역사·신앙·관습·세계관, 꿈과 낭만·웃음과 재치, 또는 생활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나 역경을 이겨내는 슬기와 용기 등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성경 이야기는 아무 의심 없이 ‘신성하고’, ‘진실하며’, ‘사실’이라고 믿어야 한다. 그러나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보다는 진실성과 사실성에 관해서도 생각해 보고, 그 이야기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믿음이 형성되어야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다. 성경 이야기를 무조건 믿다가 뒤늦게 한국이나 다른 나라의 이야기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는 믿음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사전에 두 이야기를 알고, 그 의미를 이해해 두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접해 왔기 때문에 매우 친숙하다. 그러므로 한국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흥미와 함께 역사적 지식과 교훈을 주었고,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도 갖게 해 주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바르게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성경 이야기를 이해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게 되면, 성경 이야기가 지니고 있는 의미와 가치 이해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다음의 세 가지 요령으로 집필하였다. 첫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번역 성경》의 내용을 원문 그대로 적고,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곁들였다. 둘째, 한국 이야기를 소개하고, 한국설화 연구의 성과를 압축하여 설명함으로써 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두 이야기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 지니고 있는 신앙적·교훈적 의미를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성경 이야기가 지니고 있는 신성성과 신앙적 의미도 간단히 살펴보았다.
필자는 한국 설화와 민속을 연구한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였고, 교회 장로로 봉직하였으나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으므로, 성경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이 책의 집필이 무모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한국 이야기를 공부한 기독교인 중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에서 용기를 냈다. 이 책이 한국 이야기의 이해를 바탕으로, 성경 이야기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차 례>
제1부 구약 이야기
1. 천지의 창조와 개벽
2. 인간의 창제와 진화
3. 노아의 홍수―홍수 이야기
4.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장자못 이야기
5. 아들을 제물로 바친 아브라함―인신공희 이야기
6. 요셉의 해몽―해몽 이야기
7. 버려진 아이 모세―주몽
8. 문설주에 바르는 양의 피―동지팥죽
9. 홍해를 건넌 모세―주몽
10. 아론의 싹 난 지팡이―부석사 선비화
11. 도피성―소도
12. 남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관탈민녀 이야기
13. 나병을 고친 나아만―송시열
14. 숨겨진 왕자 요아스―궁예
15. 니느웨로 간 요나―거타지
제2부 신약 이야기
1. 예수 탄생―건국 시조
2. 아기 예수 살해 기도―아기장수 이야기
3. 부자와 거지 나사로―저승재물 차용 이야기
4. 회심한 삭개오―자린고비
5. 귀신을 쫓은 예수―처용
6. 성경의 부활―재생 이야기
'알림, 생활 단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출간 (2) | 2021.05.21 |
|---|---|
| * 서평----『성경 이야기와 한국 이야기』를 읽고 (0) | 2020.12.17 |
| 옛이야기 속 행복 찾기 (0) | 2017.11.28 |
| 생거진천 사거용인(生居鎭川 死居龍仁) (0) | 2016.07.31 |
| <새번역 성경>의 좋은 점 (0) | 2016.06.30 |



